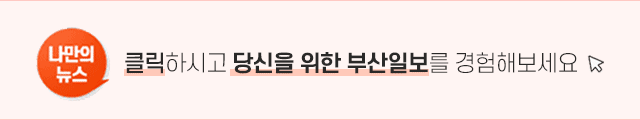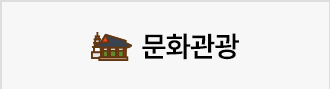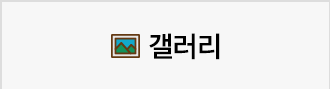경계에서 춤추다/ 서경식·타와다 요오꼬
 재일조선인 에세이스트 서경식.
재일조선인 에세이스트 서경식.
'죽어서 존엄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죽어서 책임을 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죽으면 책임을 질 수 없건만, 죽음 이외에 책임질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일본이 어떤 사안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거꾸로 끝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살이란 긍지를 지니고 혹은 절망하며 혹은 허무감에 몸을 맡겨 개인이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자살은 연극적 요소가 강하고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이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살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타와다 요오꼬 '어째서 죽음을 찬양하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중)
재일 조선인 에세이스트
독일 거주 日 여성 소설가
주고 받은 편지 글 엮어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건만 누구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은 부조리의 궁극이라고나 하겠지요. 이러한 부조리를 자신에게 강요하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의사를 초월한 절대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군 특공대로 대표되는 것 같은 국가에 의한 죽음의 강요도, 자기도취적 미화도, 바로 이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많은 자살이 실제로는 강요당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참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죽음은 지극히 드뭅니다.'(서경식 '누구나 죽어야만 한다' 중)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건만 누구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은 부조리의 궁극이라고나 하겠지요. 이러한 부조리를 자신에게 강요하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의사를 초월한 절대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군 특공대로 대표되는 것 같은 국가에 의한 죽음의 강요도, 자기도취적 미화도, 바로 이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많은 자살이 실제로는 강요당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참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죽음은 지극히 드뭅니다.'(서경식 '누구나 죽어야만 한다' 중)
재일조선인 에세이스트 서경식과 일본 여성소설가 타와다 요오꼬가 주고 받은 편지글들이 모여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서울-베를린, 언어의 집을 부수고 떠난 유랑자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경계에서 춤추다'이다. 책을 쓴 두 사람의 삶이야말로 경계에 서 있다. 서경식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재일조선인이고, 타와다 요오꼬는 일본 여성지식인으로 독일어를 제2의 모어로 삼고 있는 이민 작가. 그 경계의 삶처럼, 문화의 틈새에서 충돌하고 빚어지는 사유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은 거기서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것이다. 공개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과 내밀한 비밀을 옮기는 일기 사이의 경계적인 글쓰기, 곧 편지라는 글의 형식도 그 연장이다.
'여행' '놀이' '목소리' '순교' '고향' 등 10개의 주제에 따라 스무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집'과 '이름'을 각각 주제로 삼은 편지에서는 "집은 역사를 조망하는 전망대 같은 것"(타와다 요오꼬), "이름은 역사가 할퀴어놓은 상처"(서경식)라는 말이 나온다. 타와다 요오꼬는 동베를린에서 공산권을 연상시키는 옛건물에 살고 있다. 주변 곳곳에 통일 이전의 이런저런 아픈 역사를 지닌 건축물들과 공장의 폐허들이 있는 것이다. 서경식은 이름에 서린 역사의 아픔을 본다. '존 김'이나 '켄트 나가노' 식의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 2세, 3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의 이름들이 거의 그렇다. 이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의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바 있다. "'사이드'라는 분명한 아랍계 성에 무리하게 억지로 꿰매붙인 '에드워드'라는 바보 같은 영국이름에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는 50년 세월이 필요했다."
지은이들의 시선은 사소한 일상에서 사회·예술 분야로 종횡한다. 글은 경쾌하고 유려하면서도 진중한 무게감이 있는데, 때때로 보이는 두 사람의 미묘한 시각차나 긴장감도 읽는 즐거움에 속한다. 서경식·타와다 요오꼬 지음/서은혜 옮김/창비/240쪽/1만3천원.
김건수 기자 kswoo33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