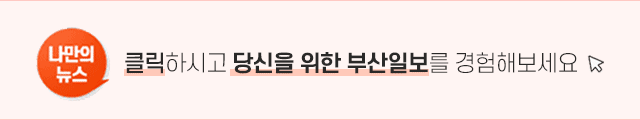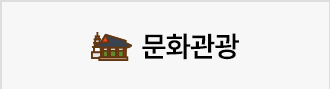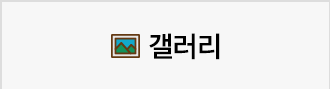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마르세유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 600년경에는 그리스 식민지였다가 한때 로마의 속주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도 이 도시는 영욕으로 점철됐다. 20세기 들어 프랑스 남부 항만도시 마르세유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 항만도시 재생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부터다. 1995년부터 시작된 ‘유로메디트로네’ 사업이 마르세유의 모든 것을 바꿔 놓고 있다. 그 중심 사업의 하나가 지중해 문명박물관이다. 해양문화 콘텐츠 하나가 어떻게 도시를 바꾸고,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살펴야 한다.
경제·문화 콘셉트로 도시재생
프랑스 항만도시 마르세유 주목
지중해 문명박물관 개관 백미
건설 과정·전시 테마 남달라
국내도 해양박물관 전성시대
지역경제 도움될 전략 세워야
모든 일의 시작은 유로메디트로네 사업에서 촉발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마르세유 항은 독일군의 공습과 점령 등으로 주요 기간시설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한때 90만 명이 넘었던 도시 인구는 1970년대 중반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은 20%대로 치솟았다. 프랑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유로메디트로네 개발공사를 출범시키고, 기존 항만부지와 배후단지 93만 평을 중심으로 개발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역사상 가장 큰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도시재생 콘셉트는 경제와 문화였다. 쓸모가 없어진 항만지역은 국제무역단지와 문화예술지구로 집중 개발됐다. 새로 만든 역사문화 공간과 지역 예술문화 공간은 마르세유가 지중해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됐다. 1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2007년부터 2기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부지도 144만 평으로 크게 늘어나고, 투자 유치권역을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까지 확대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가 정해졌다. 이렇게 되자 쇠퇴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국제 비즈니스 투자 사업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글로벌 3대 선사인 프랑스 CMA CGM 등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어왔다.
전문가들은 마르세유 항만도시 재생사업의 백미로 2013년 6월 개관한 지중해 문명박물관을 꼽는다. 로마시대부터 마르세유 항구를 지켜온 생장 요새와 옛 여객터미널 터에 들어선 지중해 문명박물관은 본래 이 사업의 핵심 개념이었던 경제와 문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박물관은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각되면서 2013년에 마르세유가 유럽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외형적인 평판보다도 이 박물관이 가진 진정한 힘은 다른 데 있다. 박물관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와의 굳건한 협력을 통해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특히 박물관 건설 과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은 개관 이후에도 자원봉사자로 힘을 보태는 한편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도시와 박물관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 박물관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유물과 전시 콘텐츠도 남다르다. 이 박물관은 100만 점이 넘는 유물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생활공동체로 삼았던 지난날의 역사적 편린과 오늘날의 문명까지 전시 테마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스민 혁명이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까지 전시장에 드러내고 있다. 박물관이 단순한 해양박물관이 아닌 지중해 문명사를 핵심 테마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박물관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해석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르세유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고, 항구가 지닌 역사적 자산과 돌 물 바람을 모티브로 한 건축 외관까지 주위 경관과 절묘하게 맞췄다. 박물관 개장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는 물론 예비 전시 등으로 분위기를 한층 띄웠다. 흥행에 성공할 만한 요소를 두루두루 갖췄다는 이야기다. 개장 첫해 이 박물관에 134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몰린 데는 이런 비결이 숨겨져 있었다.
2012년 부산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이 문은 연 이후 우리나라에 해양박물관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포항 등대박물관이 230억 원을 들여 증축에 들어간 데 이어 내년에는 울진에 해양과학관이 들어선다. 인천에도 해양박물관이 만들어진다. 내륙지역인 청주에도 해양과학관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 신항 개발지구에 바다를 주제로 한 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법 세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물관이 많아지면, 국민들의 문화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박물관의 비즈니스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이 되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최학림 기자 theo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