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연 2000억 벌고도 ‘16년 무배당’… 뿔난 소액주주
소액주주 4차 내용증명 보내며 배당 재개 요구
2009년 중단·2013년 흑자전환에도 묵묵부답
이익잉여금 1.2조·부채비율 86.3% 재무건전
투자자 1940억 유상증자 참여 후 손실 32%
PBR·PER 등 밸류에이션 업종 내 최저로 떨어져
정부 배당확대 기조 어긋 “우오현 상생가치 어디”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 2025-11-27 15:00:01
 대한해운 ‘SM PUMA호’. 대한해운 제공
대한해운 ‘SM PUMA호’. 대한해운 제공
대한해운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며 이익잉여금을 1조 2000억 원 이상 쌓아두고도 16년째 무배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해운업종 내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에 머물자 성난 소액주주들은 배당 재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SM그룹에 인수돼 흑자전환에 성공한지 12년이 지났지만 회사는 선박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한해운의 장기 무배당 기조는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소액주주연대는 전날 회사의 장기 무배당 경영에 항의하는 4차 질의서를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했다. 지난 10일 1차 질의서를 보낸 이후 회사 측과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연대는 우선 올해 주당 30원의 결산배당을 요구한다. 총 배당금은 약 97억 원, 시가배당률은 1.8% 수준이다.
대한해운은 2009년 말 별도 기준 영업손실 4881억 원을 기록한 이후 배당을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를 2013년 SM그룹이 인수한 뒤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도 배당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배당의 근거가 되는 이익잉여금은 지난 3분기 말 1조 2017억 원까지 쌓였고 같은시점 부채비율은 86.3%에 그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매년 2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주주연대는 “대한해운의 반기순이익은 약 1100억으로 이미 전년도 순이익의 약 67%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2025년 반기 기준 연결부채는 1조 8232억 원이고 기준금리가 높아 재무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해운업계는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박 투자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주주연대는 동종 업계와의 비교에서도 대한해운의 무배당 정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KSS해운은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비율이 257%임에도 28년 연속 배당(배당률 4.53%)을 이어갔다. 대한해운과 부채비율이 비슷한 팬오션 역시 5년 연속 배당(배당률 3.56%)했다.
주주들은 장기 무배당이 회사의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대한해운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이날 기준 0.28배로 업종 내 최저 수준이다. 보유 자산을 모두 청산하는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코스피 평균 PBR(1.29배)이나 KRX 운송지수(0.68배)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다.
PER(주가수익비율) 역시 3.41배로 업종 내 최저이자 코스피 전체 상장사 839개 중에서도 4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주연대는 회사가 2021년 약 19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을 당시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개선을 믿고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상증자로 292%이었던 대한해운의 부채비율은 154.3%로 떨어졌지만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어 주주들의 평가손실은 현재 3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사회환원, 행복경영,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SM 계열사인 대한해운의 경영은 회사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 온 주주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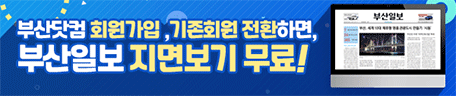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