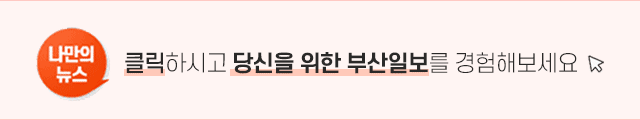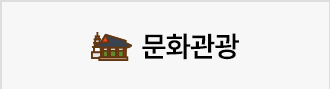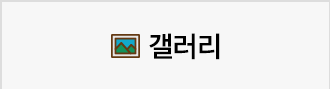서정아 소설가

오래전 여행을 갔을 때 알게 되었던 태국인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작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포도 농장에 있다고 하더니 그 이후 김 공장을 거쳐 지금은 수박 농장으로 옮겨갔다.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가끔 문자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 우리는 간단한 영어로만 대화하는데 지난 설날에 그 친구가 처음으로 한국어 문자를 보내왔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네.’ 말투가 예스럽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한국어로 새해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할 줄을 몰라서 구글 번역기를 돌렸다고 실토했다. 첨단 번역기에서 요즘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하게체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영어로 써도 되는데 굳이 나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새해 인사를 해주려던 친구의 노력이 귀여워서 혼자 조금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다. 그건 주로 한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잘되지 않았을 때이다. 정말 하다 하다 안 되어서 나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데, 때론 나조차 도중에 실패해 버려서 미안해지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그 친구가 쇼핑앱에서 세탁 세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나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앱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거기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월 회비를 내고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친구에게 설명해 주었고, 친구는 자신이 지내는 숙소가 시골이라 근처에 마트가 없기 때문에 쇼핑앱의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앱에 영어 버전이 없어서 내가 친구의 개인정보를 받아 멤버십 가입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본인 인증 과정에서 그만 막혀버렸다. 결국 멤버십 가입은 실패했고 내 계정으로 배달 주소만 바꾸어 물건을 대신 주문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자신이 가진 언어 수단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세탁 세제 하나를 주문하는 간단한 일마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20대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며 수년간 그곳에서 살았던 다른 친구 하나는, 나에게 타국에서 사는 일의 외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있는 데서 오는 감정이 아니었다. 자신은 성인으로서의 충분한 인지 수준을 가진 사람인데, 언어가 충분치 못해 간단한 행정 일조차 쉽게 처리하지 못할 때 종종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외롭다는 것이었다. 태국인 친구의 세탁 세제를 대신 주문하면서 나는 다시금 그 말이 떠올랐다. 이 친구도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오래전 태국의 로컬 식당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모국어로 유창하게 음식을 주문하던 그 친구의 환한 얼굴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빠르다. 시스템 개발도, 하드웨어 설치도, 인터넷 속도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마저도 빠른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편의성보다 장벽을 더 크게 느낄만한 소외 계층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빠름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배제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언제고 소수자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속한 시스템 속에서 느끼게 될 무력감과 외로움을 떠올리면 슬픔은 이미 내 앞에 도착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