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민주주의 도구일까?/박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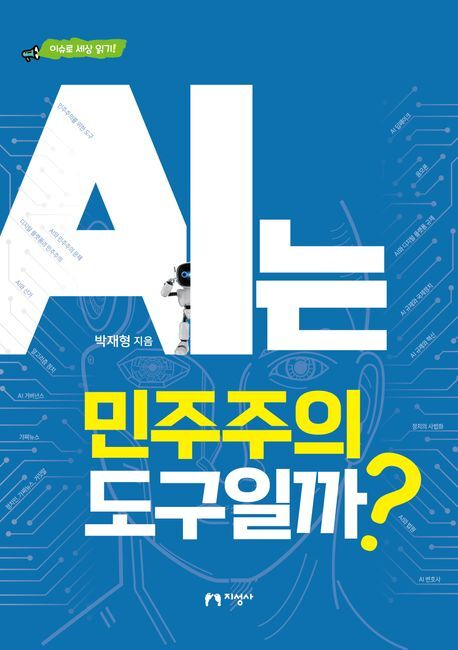
최근 몇몇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했다. 멀쩡해 보이던 녀석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차례차례 멈췄기 때문이다. 제조사 AS센터에서는 더 이상 부품이 생산되지 않아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18년 동안 묵묵히 버텨 준 걸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든 상황은 달갑지 않았다.
어쨌든 새로 들인 가전제품은 우선 겉모습부터 번듯하고 예뻐 좋았다. 더 좋았던 건 생각지도 못한 기능들이었다. 손을 대지 않고 음성으로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는 건 기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 밖에서도 켜고 끄는 등 거의 모든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 신기할 정도였다. 평소 잘 인지하지 못했던 인공지능(AI)이 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알든 모르든 일상과 접점을 넓히고 있는 AI는 사람이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주면서 편리함을 선사한다. 문제는 AI의 순기능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류에게 여러 혜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술은 필연적으로 부작용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발달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수준을 뛰어넘어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 유통을 통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AI의 부작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나 정치 이슈와 만났을 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뿌리부터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분야가 진보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정치는 되레 퇴보 중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AI는 민주주의 도구일까?>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교양서이자 정치철학서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유 기고가이자 정치학 박사인 저자는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AI가 인간 존엄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런 의도는 AI가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면의 위험성에 더 주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책이 AI의 부정적 측면만 들여다본 건 아니다. 저자는 선거를 예로 들며, AI 기반 시스템 활용이 데이터 분석 효율화와 정책 결정 간소화, 유권자 참여 확대 등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AI가 적용된 도구의 알고리즘이나 정보 필터링이 정치적 다양성을 위협하거나 편향된 정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정치권력이 교체된 미국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정치와 결합한 AI가 건전한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결정 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설파한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AI가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데이터 출처 명시, 결정 과정의 문서화 등 투명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비전문가인 대중이 이해하고 비판까지 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있을까? 저자는 민주적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독립된 규제 기관 설립과 시민사회와 정부 감시단의 역할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제시한다. 문제가 됐을 시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도 당연히 포함한다. 박재형 지음/지성사/272쪽/2만 3000원.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