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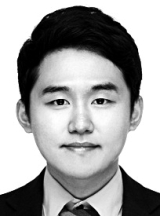
충북이 고향인 A 씨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다.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늦게나마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하지만 1년이 넘게 A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
올봄 이사를 한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는 데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집주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가 보유한 다른 주택은 있는지, 세금 체납한 적은 있는지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했다. 그래도 이사 당일까지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길거리로 쏟아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몇억씩 내어줘야 하지만, 집주인 정보는 고작 등기부등본이나 공인중개사 설명 정도가 전부다.
‘집주인’이라는 단어는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계약이 체결되면 집주인은 채무자고, 세입자는 채권자가 되지만 집주인이라는 말은 이들을 ‘주종 관계’로 엮어 버린다.
포털 사이트에 ‘집주인’을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에 ‘집주인 호칭’ ‘집주인 부르는 법’ ‘센스 있는 세입자 되기’ 등이 따라 나온다. ‘선생님’이나 ‘사장님’, 그것도 아니면 ‘정말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냐’고 묻는 웃지 못할 질문도 나온다. 게다가 계약서대로 계약을 맺었으면 됐지, ‘센스’까지 있는 계약 당사자가 될 필요가 뭐 있을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눈치를 보는 관계는 전세시장이 유일하다. ‘집 없는 설움’으로 권리는 저당 잡히고 관계는 역전된다.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끼고 집을 산다. 연쇄적인 ‘갭투자’가 결국 문제의 시발점이 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대인들은 적은 레버리지로 자산을 불렸다. 물론 임차인들도 최소한의 금융 비용만으로 실거주를 하며 편의를 누렸다. 요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라는 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임대차 2법이 뜨거운 감자로 선거판을 달굴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셋값을 한꺼번에 폭등시킨다는 임대차법의 단점은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줬던 역할마저 무시돼선 안 될 일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부동산 상승 신화에만 매몰됐던 우리 시대의 아픈 상처다. 치열한 고민과 반성,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선거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