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고 구르고 줄 타고… 이혜영 "‘파과’서 액션 원 없이 했어요"
동명 소설 영화화한 작품에서
60대 전설의 킬러 ‘조각’ 맡아
고난도 액션 소화…부상도 입어
데뷔 45년차 ‘쓸모’에 대해 생각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2025-05-06 15:25:16
 배우 이혜영이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파과’에서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NEW 제공
배우 이혜영이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파과’에서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NEW 제공
“이번 작품에서 액션 연기를 원 없이 했어요.”
데뷔 45년 차 배우 이혜영이 60대 여성 킬러로 변신해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파과’에서 전설의 킬러로 불리는 ‘조각’을 맡아 작품을 이끈다. 122분의 상영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달리고 구르고 상대와 겨루는데 지친 기색이 없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혜영은 “도전하는 마음으로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용기 있게 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작품은 60대인 전설의 킬러 ‘조각’과 젊은 킬러 ‘투우’가 20여 년 전 지독한 인연으로 얽힌 뒤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는 이야기다.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를 원작으로 ‘간신’ ‘허스토리’ 등을 연출한 민규동 감독이 영화화했다. 쉬운 배역 대신 도전을 이어온 이혜영이었지만, ‘조각’은 더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혜영은 “조각의 수수께끼 같은 힘과 힘의 원천이 궁금했고 매력적이었다”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는 비현실적이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너무 두려웠고, 촬영에 들어간 뒤에도 내내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조각과 저는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쓸모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기를 고집하는 조각의 신념이 알고 싶었죠. 편하게 배우를 할지, 한 번 도전을 해 볼지 사이에서 도전을 선택했어요.”
 영화 ‘파과’ 스틸컷. NEW 제공
영화 ‘파과’ 스틸컷. NEW 제공
도전을 하기로 했지만, 60대의 나이에 고난도 액션을 수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스크린 속 조각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가볍고 날쌘 움직임을 보여준다. 산길을 달리고, 줄을 타고, 총을 쏘며 상대와 맨몸으로 겨루기도 한다. 액션 연기를 하면서 부상도 입었다. 그는 “싱크대에 부딪히는 장면을 찍다가 갈비뼈가 나갔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면을 찍을 땐 손목이 나갔다”며 “조깅하는 장면을 찍을 땐 발목이 아파 정형외과에 갔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뭘 하기만 하면 병원행이었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부상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몸은 몸대로 망치는데 영화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불안감과도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영화 ‘파과’ 스틸컷. NEW 제공
영화 ‘파과’ 스틸컷. NEW 제공
그런 그의 불안감은 지난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첫선을 보인 뒤 사라졌다. 이혜영은 “그때 관객들이 꽉 찼는데, 한국어 대사를 자막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재밌게 보고 환호도 했다”며 “거기서 제가 비로소 안심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 감독님에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싶어 좀 미안했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서 민 감독과 호흡을 맞추면서 배운 점도 많다고 했다. “지금까지 모든 감독이 저를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연기를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늦게 나타나 현장을 바꾸고, 저 벽을 뜯어 카메라를 옮기라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민 감독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콘티 안 읽어보셨어요? 스태프 100명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콘티를) 안 보고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고, 배우로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혜영은 이번 작품을 하면서 조각의 대사처럼, ‘쓸모’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쓸모’ 보다는 오히려 ‘쓸모없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요. ‘내가 쓸모 있는 배우로 살아남으려면 민 감독님의 프로세스에 익숙해져야겠지!’였어요. 이번 작품은 앞으로 쓸모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한 훈련이 됐죠. 배우로서 살아남는 게 이런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웃음)”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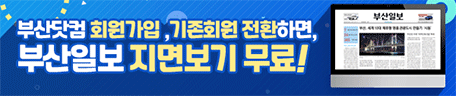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