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영화의 천만행진은 계속됐다. 하지만 모두가 축배를 드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정 영화로의 지나친 쏠림이 한국 영화시장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영화계도 다양한 종(種)들이 공존해야 건강함이 유지되는 일종의 생태계다. 포식자 (천만영화)도 있고 초식동물(다양성 영화)도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살아남으면 생태계는 훼손된다.
외국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M 영화사의 K대표는 요즘 힘들다. 몇 년 간 중국에서 직수입했던 영화들이 한국 내 심의를 받지 못해 개봉할 길이 막막해서다.
중국 영화산업이 성장하고 한중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회사는 `중국영화 전문 수입사'로 방향을 잡고, 몇 년 전부터 해외에 소개되지 않은 우수한 중국영화들을 구매해왔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영화들이 국내에 심의를 받아 개봉할 통로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외국영화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수입 계약서와 `아포스티유'(Apostille-외국 공문서에 대한 자국 영사관의 인증을 폐지하는 국제협약)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제껏 수입된 다른 중국영화는 한국과 이미 아포스티유협약이 체결된 홍콩 또는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했기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 영화사는 우직하게도(?) 중국 본토에서 영화를 직접 수입했고, 한국과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중국영화를 수입하려면 영화마다 매번 중국 현지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을 거쳐 현지 영사관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 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사의 법인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원본과 법인 인감을 가지고 중국 공증처(관공서)에 방문해야 한다.
가격이 높지도 않은 중국영화의 거래를 위해서 매번 수입자와 판매자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 양쪽 모두 지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제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금전적으로 아쉬울게(?) 없는 중국의 판매자들(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특유의 정서상 관공서의 출입 자체를 꺼린다)에게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고문에 가깝다.
이런 사정이니 한국 수입사는 대금을 지불해 놓고도 몇 년간 영화를 풀지 못해 자금이 묶이고, 회사 경영의 리스크까지 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오로지 제도가 바뀌길 마냥 기다리는 것뿐이다. 영화라는 일종의 `신선식품'이 유통기간이 다 지나 선도가 떨어지건 말건 말이다.
실제로 M 영화사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진정을 했지만 그때마다 "제도의 불합리성은 인지하고 있으니 바뀔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물론 `일개' 영화사가 제도를 바꿀 순 없다. 그런데 정작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렇게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대답은 커녕,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문제를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공서와 협의할 때 마다 발생하는 가장 짜증나는 순간은 영화 수입업자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중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문화교류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거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교류는 절대 일방적 흐름으로 유지 될 수 없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은근히 한류를 견제하는 속내를 비치는 것도 이런 문화적 일방성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문화교류의 쌍방성과 한국 영화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영화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내세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김익상 교수(서일대학교 영화방송예술과,영화기획자)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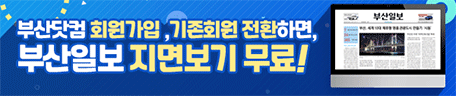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