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승이자 대강백인 종범 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듣다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법문의 요지는 이렇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학자들이다. 식당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다가가, 단체 손님이 온다고 자리를 조금 옮겨 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옮기는데 학자들은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학자들은 자기 주장이 최고인 줄 알고 남과 타협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런 학자들의 고집과 권위는 ‘빛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때문이다. 질문만 잘 하면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해답을 내놓는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AI 열풍 앞에 학자들의 입지는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학자는 통역가와 번역가 다음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직업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
명확한 답이 있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연과학 분야는 비교적 논란이 덜한 편이지만 인문학 분야는 학자들 간에 주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다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 환단고기가 위서인가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료가 풍부하지 못한 상고사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다.
임진왜란 역사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여수인가 아니면 한산도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측의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어 민망할 뿐이다. 합포해전지가 마산 합포인가 진해 학개인가를 놓고도 해묵은 논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러 갔던 합천의 권율 원수진이 어느 동네인가도 연구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유독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방도 예사로 한다. 지식 카르텔을 형성하여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태는 모두 충무공의 영전에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따라 20년 이상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스스로 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해전 현장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편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출판사 사장은 필자를 두고 발로 뛰는 ‘바다의 고산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고산자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의 호다. 서재에서 문헌만 연구하는 것은 나의 자유분방한 성정과도 맞지 않다. 역사기행 수필가나 시인이 내게는 더 잘 어울리는 타이틀이다.
그동안 350회 이상 이순신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태풍에 갇혀 섬에 고립된 적도 있었고, 날이 저물어 외딴 암자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적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섬은 거의 다 섭렵했고 결국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오곡도라는 작은 섬에 내 영혼의 짐을 내려놓았다. 섬마을 토담집을 수리하여 이순신 전적지 답사를 위한 베이스캠프를 하나 마련했다.
종범 스님의 법문은 AI 시대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AI가 역사학자들을 능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문헌학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먼저 AI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AI가 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낭 하나 메고 이순신 장군의 해전 현장을 다니면서 역사의 진실을 캐고 구전설화를 채록하며, 별빛 쏟아지는 밤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만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확신한다.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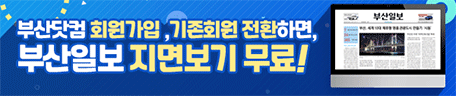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