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극장가는 잠잠합니다. 연휴 기간에 맞춰 개봉하는 한국 영화는 13일 개봉작인 ‘베테랑2’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명절 연휴에 극장을 찾는 관객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현재 상영 중인 영화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개봉한 지 한 달도 넘은 ‘디베르티멘토’의 관객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영화는 현재 일반 상영관에선 보기 힘들지만,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선 가능합니다. 주말인 14, 15일 연달아 상영하는 ‘디베르티멘토’를 감상해봤습니다.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금녀의 벽’을 넘은 감동 실화는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소재입니다. 미국의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일생을 다룬 ‘세상을 바꾼 변호인’(2019)이 대표적입니다. 긴즈버그는 1950년대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한 9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해 이제는 여성 변호사가 남성보다 많아졌습니다. 올해 1월 전미법률직업협회(NALP)는 지난해 미국 로펌에서 일한 여성 변호사 비율이 5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금녀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국내 개봉한 영화 ‘디베르티멘토’는 아직도 전 세계 6%에 불과한 여성 지휘자들 중 한 명인 자히아 지우아니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이민 가정 출신 여성 지휘자가 마주했던 이중차별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95년입니다. 프랑스 파리 교외의 이민자 가정 출신인 17살 비올라 연주자 자히아(울라야 아마라)는 지휘자를 꿈꿉니다. 학교에서 연주는 물론 지휘도 경험한 자히아는 첼리스트인 쌍둥이 자매 페투마(리나 엘 아라비)와 함께 파리의 명문 음악 고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새 학교 선생님은 자히아를 믿고 지휘를 맡기지만, 콧대 높은 파리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촌동네 이민자 출신’이라며 대놓고 무시하고, 면전에서 불만을 터트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성별입니다. 자히아처럼 지휘자를 지망하는 부잣집 도련님 랄르망은 “여자가 무슨 지휘냐”며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겁니다. 철딱서니 없는 남학생들도 도련님의 앞잡이를 자처해 조롱에 가세합니다.
자히아는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각 연주자에게 필요한 개선점을 세심히 짚어 주고, 연주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작곡가의 의도를 설명해 줍니다. 자히아의 진심을 알아보는 친구도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합니다. 편견의 벽은 한없이 높고, 유리천장은 정수리에 닿을 듯 낮습니다. 지휘자가 되려면 곡을 연주해 줄 오케스트라가 필요한데, 동급생들은 물론 학교 교장과 음악원 원장도 비협조적입니다. 결국 자히아와 페투마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 ‘디베르티멘토’라는 오케스트라를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영화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형적인 성장 드라마입니다.
성장 영화는 음악과 맞물리면 시너지가 납니다. ‘원스’(2007)처럼 남녀가 음악을 매개로 사랑에 빠지고 함께 성장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위플래쉬’(2015)처럼 자신을 채찍질하며 월등한 실력을 갖추게 되는 영화도 있습니다. ‘디베르티멘토’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위플래쉬’에 주인공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스승 플레쳐 교수가 있다면, ‘디베르티멘토’에는 자히아에게 당근을 조금 주고는 채찍을 매섭게 휘두르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세르주 첼리비다케(닐스 아르스트럽)가 있습니다. 첼리비다케는 “지휘는 여성의 직업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자히아의 열정과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직접 가르칩니다. 첼리비다케는 인간적인 면모도 있지만 지휘 수업 때는 플레쳐 교수 못지않은 폭언과 비평을 쏟아냅니다.
영화는 자히아와 페투마가 좌절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청년 음악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 보여 줍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내실을 단단히 다집니다.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꺼진 열정도, 깨진 화합도 되살리는 ‘음악’
2005년 프랑스여성영화인협회를 창립한 마리-카스티유 망시옹-샤르 감독은 영화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지만,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데 매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자 출신인 자히아 가정의 삶을 통해 타자화와 차별의 문제를 짚고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합니다. 빈부 격차, 지역 차별에 대한 지적도 담겼습니다. 자히아의 꿈을 짓밟는 수도 파리와 자히아의 꿈이 펼쳐지는 교외 도시 스탱의 대비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각종 장벽을 뛰어넘는 화합과 연대가 결국 음악을 통해 이뤄지면서 음악 영화 본질에도 충실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해 한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다악장의 희유곡을 뜻하는 ‘디베르티멘토’라는 제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영화 ‘디베르티멘토’. 찬란 제공
특히 실패를 거듭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자히아가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되는 결말부는 잔잔한 감동을 안깁니다. 켜켜이 쌓인 음표들이 화합을 빚는 연출은 약간 작위적인 면모가 있기는 해도 낭만이 있어 울림을 줍니다.
‘디베르티멘토’의 핵심 매력 중 하나는 배경 음악입니다. 한 번쯤 들어 봤을 클래식 명곡이 극 중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적절히 활용됐습니다. 이 정도면 클래식 명곡 메들리 수준입니다. 특히 라벨의 ‘볼레로’를 선곡한 대목에서 감독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주요하게 사용된 프로코피예프의 ‘기사들의 춤’이나 생상스의 ‘바카날’도 몰입을 돕습니다.
또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7번, 슈베르트 교향곡 5번 등 반가운 명곡들이 요소요소에 등장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줍니다.
영화는 실화 바탕이지만 극적인 갈등이나 연출로 감동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절제된 연출로 깔끔하고 담백하다는 느낌입니다. 관객 성향에 따라 단조롭고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음악,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극장에서 관람할 만합니다.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디베르티멘토 오케스트라가 자히아 지우아니의 지휘 아래 프랑스 국가를 연주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디베르티멘토 오케스트라가 자히아 지우아니의 지휘 아래 프랑스 국가를 연주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올해로 46세인 자히아 지우아니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1998년 디베르티멘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결성했습니다. 2007년엔 알제리 국립교향악단의 첫 객원 지휘자가 됐고, 청년 음악가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디베르티멘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의 낙하산 퍼포먼스가 펼쳐졌던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 당시 프랑스 국가 연주를 지휘한 것도 바로 지우아니였습니다.
지난달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지우아니는 영화 제작진에게 “더 많은 여성 지휘자를 세상에 보여 주고, 젊은 여성들이 자신도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자신의 꿈을 믿어야 한다. 노력과 인내,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화 ‘디베르티멘토’를 보고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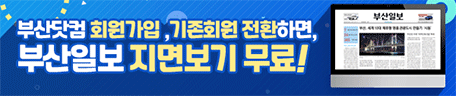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