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패스벤더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았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한 스파이 영화. 바로 지난 19일 개봉한 영화 <블랙 백>입니다. 상영관도 적고 홍보가 부족하지만 재미가 없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작품을 극장에서 관람했습니다.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블랙 백>은 영국 정보국 내부의 배신자를 축출하는 이야기를 그린 첩보 스릴러물입니다. 정보국에는 신임받는 베테랑 요원 부부 조지(마이클 패스벤더)와 캐슬린(케이트 블란쳇)이 있습니다. 조지는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을 수 있는 정보국 비밀 무기 ‘세버러스’를 외부로 유출한 조직 내 배신자를 찾아야 합니다. 추려진 후보는 5명. 문제는 그중에 아내인 캐슬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AI처럼 냉철한 조지는 캐슬린도 그대로 용의선상에 올린 채 함정수사를 이어갑니다. 몇몇 후보들은 어딘가 의뭉스러워 보이고, 캐슬린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들도 드러납니다.
극을 연출한 스티븐 소더버그는 다재다능한 감독입니다. 소더버그만큼 화려하게 입봉한 감독은 많지 않습니다. 장편 데뷔작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1990년)>로 1989년 제4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액션 연출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등 걸출한 스타들을 앞세운 케이퍼 영화 <오션스> 시리즈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그러나 <블랙 백>에선 첩보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션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치밀한 심리전과 수싸움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등장 인물들은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사를 소화하는데, 관객 성향에 따라 지루하거나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실제로 CGV 실관람객 후기를 살펴보면 ‘대사가 아주 많다’는 평가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추리를 전개해 나가고, 각 대사의 내용도 밀도가 높습니다. 일순간 대사를 놓치면 흐름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정도입니다. 기자 역시 일부 대목에선 지나친 대사량으로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커플 관계입니다. 조지와 캐슬린은 부부고, 캐슬린을 제외한 4명의 배신자 후보 역시 각각 커플입니다. 이들의 사적인 갈등이 사건 전개와 맞물려 첨예해지는 순간들은 꽤 흡입력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 ‘블랙 백’은 극에서 ‘기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내일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그건 ‘블랙 백’이다”며 알려주지 않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요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관객은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조지와 함께 추리하고 의심하며 자연스레 극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 부부가 두 커플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는 시퀀스는 폭발적입니다.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배우들의 호연도 인상적입니다.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다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관객들이 첩보 스릴러물에서 기대하는,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의 극한의 서스펜스를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을 좀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연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와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는 역시 대단했지만, 두 배우의 필모그래피에 남을 만한 연기였는지는 의문입니다. 패스벤더는 <더 킬러(2023년)>에서 보여준 것 같은 냉철하고 건조한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했지만, 캐릭터 자체의 매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혹적이고 미스터리한 캐슬린은 케이트 블란쳇과 아주 ‘찰떡’이었고 임팩트도 강했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아쉽습니다.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영화 <블랙 백>. 유니버셜픽쳐스 제공
시작과 끝이 잘려 나간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몰입을 위한 예열과 여운을 남기기 위한 뒷맛이 부족합니다.
영화는 별다른 서사 ‘빌드업’ 없이 ‘조지가 정보국 내 스파이를 찾아야 한다’는 설정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선뜻 몰입도 안 되고, 조지라는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완급 조절을 통해 클라이맥스에서 터트리는 ‘한 방’은 있으나, 그게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때릴 정도는 아닙니다. 결말부 역시 갑작스레 마무리되는 느낌이 강해 허무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소더버그의 건재함을 알리는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현악기 중심의 음악 활용은 좋았습니다. 해외 평론가들은 ‘아주 정교한 스릴러물’이라고 호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한 미국 잡지의 평에 좀 더 공감합니다.
<재커빈>지는 영화에 대해 “볼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엉성하고(sloppy)”, 결말이 “터무니없다(ludicrous)”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재커빈>지의 영화 <블랙 백> 평론 기사. ‘블랙 백: 별로 볼 것이 없다’ 제하 기사에서 영화를 혹평했다. <재커빈>지 웹사이트 캡처
미국 <재커빈>지의 영화 <블랙 백> 평론 기사. ‘블랙 백: 별로 볼 것이 없다’ 제하 기사에서 영화를 혹평했다. <재커빈>지 웹사이트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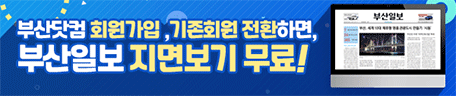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