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3층 누각 처마에 걸린 기존 한자 ‘광화문(光化門)’ 현판은 유지하되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이 추가된 예시 그림. [광화문훈민정음체현판 설치국민모임 제공] 연합뉴스](/nas/wcms/wcms_data/photos/2026/01/29/2026012916140245192_l.jpg)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3층 누각 처마에 걸린 기존 한자 ‘광화문(光化門)’ 현판은 유지하되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이 추가된 예시 그림. [광화문훈민정음체현판 설치국민모임 제공]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3층 누각 처마에 걸린 기존 한자 ‘광화문(光化門)’ 현판은 유지하되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이 추가된 예시 그림. [광화문훈민정음체현판 설치국민모임 제공] 연합뉴스
드디어 걸린다. 오랜 세월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서울 광화문 현판 문제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3층 누각 처마에 걸린 기존 한자 ‘광화문(光化門)’ 현판은 유지하되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다는 내용이다. 최 장관은 “광화문은 우리 현대사의 역동적인 상징이자 현재 진행형의 공간인 만큼 한자 현판이 지닌 의미를 존중하되 한글 현판을 추가해 그 상징성을 더욱 확장하자는 취지”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현판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반가움과 함께 묘한 감회를 안긴다.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968년 광화문에 내걸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현판을 둘러싼 사례가 말해주듯 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2010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철근 콘크리트 광화문이 철거되고, 원래 자리에 돌과 나무로 지은 광화문이 공개되면서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의 한자 현판(門化光)이 걸리자 그간 잠잠하던 한글 현판의 위상과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야 정부는 한자 현판은 유지하되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걸려 있는 한자 광화문 현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걸려 있는 한자 광화문 현판. 연합뉴스
■16년 현판 논쟁의 본질
광화문은 1395년 태조 때 창건된 경복궁의 남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1865년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다시 세워졌다.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일부가 훼손된 광화문은 1968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씨로 현판을 내걸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철근 콘크리트 광화문이 철거됐으며, 2010년 원래 위치에 돌과 나무로 만든 광화문이 공개됐다. 이때 1865년 중건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이 쓴 흰 바탕에 검은색 한자 ‘光化門’ 현판이 복원돼 걸렸다. 그러나 석 달 만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로써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사료 검토를 거쳐 2023년 10월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의 한자 현판이 새로 설치됐다. 2024년에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한글 현판 설치를 제안했지만 문화재 복원 원칙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광화문 현판의 모습이다.
이처럼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이상하리만큼 길었다. 한글이냐 한자냐라는 단순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십수 년을 맴돌았다. 현판 하나를 거는 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논쟁은 문화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결단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시간이었다. ‘원형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절대화하려는 관점과 문화재 역시 현재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 그 결과 국가의 얼굴인 광화문은 오랫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갖지 못했다.
 2022년 6월 광화문 현판 모습. 현판의 '광'(光) 자와 '화'(化) 자 사이에 미세한 금이 보인다.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사료 검토를 거쳐 2023년 10월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의 한자 현판이 새로 설치됐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광화문 현판 모습. 현판의 '광'(光) 자와 '화'(化) 자 사이에 미세한 금이 보인다.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사료 검토를 거쳐 2023년 10월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의 한자 현판이 새로 설치됐다. 연합뉴스
■광화문, 살아 있는 상징
광화문은 처음부터 ‘광화문’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 이 문은 정문(正門)이라 불렸다. 세종 8년 정문을 광화문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다. 세종 13년에 문이 완성돼 현판이 달렸고, 세종 30년 <태조실록>을 증수(增修)하면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공식 기록으로 굳어졌다. 이는 사소한 개명이 아니었다. 이름은 곧 의미였다. 기능을 드러낸 ‘정문’에서 ‘빛이 널리 비친다’는 뜻의 광화문으로 바뀌는 순간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상징의 공간이 됐다. 세종은 일찍부터 광화문이 갖는 공간의 의미를 알아챈 셈이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어쩌면 광화문이야말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지금도 축제와 추모, 환희가 교차하는 현재진행형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언어로 세계와 대화하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마치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그런 장소이기에 현판이 오직 1865년의 모습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보존의 원칙이 오롯이 ‘원형 유지’에만 머문다면, 그건 살아 있는 역사를 박제해 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광화문 앞에는 세종로가 펼쳐지고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 앞에 정작 세종이 만든 글자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이러니다. 이는 한글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한글 현판을 더 얹는 일은 장식을 하나 보태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의 표현이다. 더불어 경복궁과 광화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얼굴을 더 분명히 전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4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 풍경. 부산일보DB
2024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 풍경. 부산일보DB
■한글·한자 현판이 갖는 의미
정부의 이번 절충안은 타협일까, 아니면 진일보일까. 후자에 가깝다. 잠시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자. 그가 오늘의 광화문을 본다면 오롯이 한자만을 고집하라고 했을까. 세종은 기존 질서와 전통을 부정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백성이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질서를 허문 것이 아니라 질서를 더 많은 사람의 것으로 넓힌 선택이었다. 광화문에 한자 현판을 남기고 한글 현판을 더 얹겠다는 결정은 바로 이 세종의 정신과 닿아 있다. 기존 한자 현판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재 복원 원칙을 존중하는 일이다. 여기에 한글 현판을 더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시민과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보태는 행위다.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징을 현재화하는 선택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한글 현판 추가 설치 논의는 특정 정부의 성과나 실책으로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유인촌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가 병기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현판이 둘이면 상징이 흐려진다’는 우려도 분명 있다. 하지만 세계의 유산은 이미 복수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자금성이 만주어와 한자를 병기했듯이 언어의 병존은 혼란이 아니라 역사적 깊이와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자 현판이 1865년의 시간을 말한다면, 한글 현판은 지금의 시간을 말할 것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다. 우리는 그 문자를 스마트폰 자판과 K 콘텐츠 자막을 통해 세계에 내보내면서도 정작 우리의 얼굴이라 할 광화문에는 오랫동안 한자만 걸어 두었다. 기묘한 자기부정이었던 셈이다. 한글을 세계에 알리면서도 국가의 상징에는 새기지 못했던 모순. 한글 현판은 이를 깨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나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다시 쓰는 선언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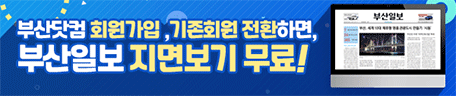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