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폐’ 논란 한화우…“인정 못 해, 15일 예정대로”
소수 주주 대통령실 탄원 등 논란 확산
“1우선주 보통주 전환, 다시 공개하라”
한화 “작년에 이미 상폐 추진 통보해”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 2025-07-08 14:05:09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 제공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 제공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한화가 오는 15일 예정대로 제1우선주(한화우)에 대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 소수 주주가 ‘고의 상폐’라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오는 15일 1우선주(한화우)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상장 주식 수가 19만 9033주로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 주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이 6개월 넘게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한국거래소는 1우선주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 미만인 점을 들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화는 지난해 7월 이사회를 열고 주식 전량을 장외 매수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상장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낮은 유통량과 거래량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과 시세조종 가능성, 그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장외 매수 가격은 주당 4만 500원으로, 3개월 평균가 대비 24.5%, 1개월 평균가 대비 19.8% 높은 수준이었다. 이사회 전일 종가보다도 11.4% 높았으며, 보통주 시세(약 2만 9000원)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관련 내용은 공시를 통해 즉시 투자자에게 전달됐다.
약 20일간의 장외 매수를 통해 한화는 1우선주 25만 2191주를 확보했고, 이를 작년 12월 전량 소각해 상장 주식 수는 19만 9033주로 줄었다. 상장 폐지 요건 충족이 이뤄진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과 관련 리스크를 여러 차례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주주는 전날 부당하게 상장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 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해, 고의로 상장 폐지를 하고 소수 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다. 소수 주주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주당순자산가치(BPS)를 반영한 가격으로 다시 공개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화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완강한 입장이다.
한화는 보통주 전환의 경우 현행 정관상 불가능하며, 이를 실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1우선주에만 전환권을 부여한다면 3우선주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3우선주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보통주 주식 수는 2000만 주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정리매매 기간에 매수하더라도 단일가 매매로 인해 가격 제한 폭이 없는 데다가 회사의 매수 한도도 전체의 1%로 제한돼 있어 7일간 단 7% 정도만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PS 기준 매수 요구 역시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BPS는 11만 2000원으로 1우선주의 6월 말 기준 종가(7만 1100원)보다 57.5% 높고, 상반기 평균가인 4만 4600원보다는 151.1%나 높다. 현재 4만 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3우선주는 물론이고,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8만 4000원)보다도 가격이 높아 BPS 기준 매수 자체가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히 한화는 상장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 등이 작년 7월 장외 매수·상장 폐지 계획 공시 이후 주식을 거래한 정황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상장 폐지가 예정된 주식을 대량으로 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화는 상장 폐지 이후에도 장외 매수 등 후속 대책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 관계자는 “모든 주주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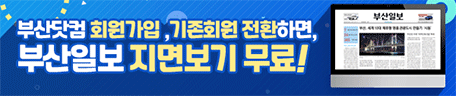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