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2025] 한국 첫 국제영화제 성장과 성장통, 곁에서 지킨 ‘영화 사랑’
2. 시민과 함께 30년
1994년 영화제 창설 공개 논의
제1회 BIFF 18만여 관객 모여
센텀 시대 전환하며 외연 확장
관객 주도 ‘커뮤니티비프’ 안착
다이빙벨 사태에 인사 내홍까지
여러 위기 넘기고 쇄신에 박차
아시아 신예 감독의 요람 역할
30주년… 변신과 도약 기대감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2025-09-14 19:06:25
 부산 중구 남포동 극장가에서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민의 사랑 속에 성장해 어느덧 30회를 맞았다. 영화제의 중심은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넘어갔지만, 관객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비프’ 행사 등은 남포동에서 열린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중구 남포동 극장가에서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민의 사랑 속에 성장해 어느덧 30회를 맞았다. 영화제의 중심은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넘어갔지만, 관객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비프’ 행사 등은 남포동에서 열린다. 김종진 기자 kjj1761@
199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30회를 맞았다. 부산 중구 남포동 극장가에서 시작한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의 요람을 넘어 영화산업 허브로 성장했다. 국내 영화산업의 폭발적 성장 속 ‘다이빙벨 사태’ 등 BIFF의 굴곡진 역사는 한국 영화사와 궤를 함께했다.
■BIFF호 첫 출항까지
부산은 한국 영화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도시다. 1958년 한국 최초의 영화상인 부일영화상이 제정됐으며, 이는 이후 역사적 맥락에서 부산국제영화제로 이어지는 뿌리가 됐다.
BIFF 창설 논의는 1990년대 초반 이용관·전양준·김지석 등이 해외 영화제를 다니며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1994년 11월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영화제 창설과 지역 영화 제작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다뤄지며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이듬해 김동호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집행위원장으로 합류하며 체계가 갖춰졌고, 1996년 9월 남포동에서 한국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첫 출발을 알렸다.
제1회 영화제는 31개국 169편을 상영하며 18만여 관객을 불러 모았다. 개막작은 마이크 리 감독의 ‘비밀과 거짓말’이었다. 뉴 커런츠, 아시아 영화의 창, 코리안 파노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아시아 신인 감독의 요람”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해졌다. 첫 회 티켓 예매는 부산은행 전산망을 통해 이뤄졌다. 은행 업무 시간 내에만 예매를 할 수 있는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남포동 시대’에서 ‘센텀 시대’로
BIFF의 성장은 시민과 함께한 궤적이었다. 초창기 영화제의 중심 무대는 중구 남포동 일대였다. 이곳은 영화제를 계기로 극장가가 새롭게 단장됐고, 영화제의 상징적 무대로 자리했다. 1996년 ‘PIFF광장’으로 명명된 이곳은 이후 명칭이 ‘BIFF광장’으로 바뀌며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제 상영작과 관객 규모가 해를 거듭하며 크게 늘자 새로운 거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1년 해운대구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이 개관하면서 영화제는 안정적인 상영 인프라를 확보했고, 부산의 대표적 문화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이로써 영화제는 ‘남포동 시대’에서 ‘센텀시대’로 전환하며 외연을 확장했다. 같은 해 도시 명칭 표기 변경에 맞춰 PIFF에서 BIFF로 공식 명칭을 바꾼 것도 국제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영화제의 중심이 남포동에서 센텀시티로 넘어가면서 시민 참여 기회가 줄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영화제 측은 2018년 관객이 직접 주도하는 영화제의 형식을 실험하며 남포동 중심의 ‘커뮤니티비프’를 출발시켰다. 2021년에는 부산 전역으로 영역을 확장한 ‘동네방네비프’를 시작했다. 해변, 아파트 단지, 공항, 공원, 소규모 극장 등 생활권 공간을 무대로 삼아 시민 누구나 BIFF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 감독들의 등용문
BIFF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신예 감독들의 요람이자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1997년 BIFF에서 ‘초록물고기’를 선보인 이창동 감독은 이후 ‘밀양’ ‘버닝’으로 칸 경쟁부문에 진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봉준호 감독도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2000)를 BIFF에서 처음 소개하며 이름을 알렸고, 훗날 ‘기생충’(2019)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다. 류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로 충무로에 입성한 뒤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IFF는 세계적 거장들에게도 출발점이 됐다. 중국의 지아장커 감독은 ‘샤오우’(1998)로 뉴 커런츠 상을 수상하며 국제 영화계에 데뷔했고, 이후 ‘스틸 라이프’(2006)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으며 거장 반열에 올랐다. 2000년 ‘정오의 낯선 물체’로 BIFF에 초청받은 태국의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은 이후 ‘엉클 분미’(2010)로 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며 세계적 명성을 확립했다.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역시 BIFF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다. 고레에다 감독은 ‘어느 가족’(2018)으로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이빙벨 사태’ 등 부침도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부산시가 제동을 걸었지만, 영화제는 상영을 강행했다. 이 결정은 이후 보조금 삭감과 고발로 이어졌고, 영화제의 독립성 논란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세계 유수 영화제와 국내 영화인들은 연대해 ‘세이브 BIFF’ 운동을 펼쳤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영화제 자율성의 가치를 확인하는 전환점이 됐다.
2023년에는 인사 내홍이 불거졌다. 당시 이용관 BIFF 이사장 등은 기존 정관에 없던 ‘운영위원장’ 자리를 신설하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영화인을 여기에 임명하면서 인사 전횡과 사유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영화제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내부 갈등이 폭발했고, 이후 이 전 이사장이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외부 간섭이 원인이었던 ‘다이빙벨 사태’와 달리 내부 균열에서 비롯된 인사 문제는 BIFF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올해 30회를 맞은 BIFF는 새 지도부와 함께 쇄신에 나선다. 지난해 선임된 박광수 이사장에 이어 올해 정한석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며 체제를 재정비했다. 국제경쟁 섹션 신설과 ‘부산 어워드’ 제정, 아시아영화 100선 특별전 진행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30년의 궤적 속에서 BIFF는 도전을 이어왔다. ‘영화로 아시아를 잇는다’는 초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30년, BIFF가 앞으로도 아시아 영화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적 영화제로 빛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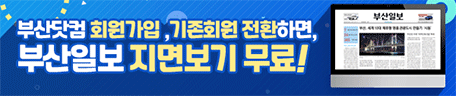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