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좋지만 여권 ‘속도전’ 온당한가… 떠오르는 신중론
여권, 재정 인센티브 앞세워 행정통합 속도전
민주당, PK 단체장에 통합 결단 압박
6·3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 시점 쟁점으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1-26 16:51:09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여권이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이 술렁인다. 정부와 여권은 막대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앞세워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권한 이양 등 제대로 된 통합이 필요하다며 여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비수도권 지자체 간 ‘생존 서바이벌 게임’처럼 진행되는 현재 논의 방식 대신 지방선거 전 통합 원칙에 우선 합의하고, 통합 지자체장 선출 등 완료 시점을 다소 열어두는 방식의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행정통합에 대한 결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통합 참여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 방문 당시 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 울산시당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즉각적인 통합 참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여권의 행정통합 드라이브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울산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거론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의 어려움과 관련해 그는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통합 추진에 대한 이견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선거 전 통합단체장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워 행정통합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약속한 상태다. 정부가 연일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는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보다 통합이 늦어질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을 향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야권 인사들까지 여권의 행정통합 속도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진 시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상향식’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현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점과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방재정권 확보와 핵심 권한 이양 없이 서둘러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름만 통합’에 그칠 수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는 신중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당시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각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됐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통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통합은 그대로 강행됐다. 이로 인해 출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창원시는 통합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정치권 주도로 이뤄진 하향식 통합이 지역 간 갈등을 남겼고, 창원 중심의 자원 배분과 행정 운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산과 진해가 각각 창원시 산하 구로 편입되면서 지역의 목소리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에서도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기습 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행정통합에 대한 부산·경남 시민들의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부산·경남 시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에 달했다. 찬반을 떠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이날 부산시에 최종 의견을 전달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후보자들이 통합 원칙과 조건에 합의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단체장들의 ‘기득권 유지’ 우려도 근거가 없지는 않은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치러지는 2028년 총선에서 현 단체장 임기 단축을 전제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속도만 앞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여권 입장에서도 통합을 성사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통합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양 지자체장을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대안들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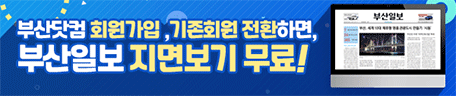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