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기 교수의 선친 이규상(2006년 작고) 씨와 어머니 전봉희(88) 여사.
이만기 교수의 선친 이규상(2006년 작고) 씨와 어머니 전봉희(88) 여사.스무살 나이에 천하장사가 되고보니 질시의 눈초리도 많았다. 실력보다는 운이 좋아서 되었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하기야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씨름 선수가 된 것이 기적같은 일이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곡소마을이다. 마을 뒷산은 의령의 진산 자굴산(897m)이다. 마을 앞쪽으로는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보인다. 학교를 파하면 책보따리를 대청마루에 휙 던져놓고 친구들과 소먹이러 가는 게 일이었다.
소꼴을 베다가 배가 고프면 입술이 보랏빛으로 새파래지도록 진달래꽃을 따먹었다. 5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나 먹는 것조차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린시절에도 건장하고 신체가 컸을 것으로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의령 모의초등학교 때는 얼굴이 새카맣고 몸피가 작아 키로 매기는 번호가 늘 앞에서 10번 이내였다. 빼빼 말랐지만 뼈대만은 굵었다. 살아계셨으면 올해 아흔둘이실 선친 '규자 상자' 어른은 어려운 살림에도 줄줄이 딸린 자식들을 그리 배 많이 안 곯리고 잘 건사한 부지런한 분이셨다. 또래 어른들 가운데 덩치도 크고 근력도 좋았다.
늦둥이 부끄러워 독초 먹어
나무서 추락 맞아 죽을 뻔
어릴 때 말랐으나 뼈대 굵어
어머니 전봉희(88) 여사는 가끔 막내인 나를 그윽하게 보시며 까닭모를 미소를 짓곤 한다.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알고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나를 두 번이나 죽이려 하셨다.
실제 어머니는 강한 분이다. 의령 모의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다. 이웃집 다람쥐를 잡으러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 잠시 기절을 했던 모양이다. "만기가 죽었소." 동네사람들이 어머니를 불렀다. 삼베를 짜던 어머니가 뛰어왔는데 몽둥이를 들고 계셨다. 병신이 될 양이면 때려 죽인다고 했다. 겁이 나 벌떡 일어나 뒷산으로 도망쳤다.
알고보니 그 때 못 일어나면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고 보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다. 도망을 가는데 얼굴에 피가 주르르 흘렀다. 이마가 많이 찢어졌다. 머리와 이마의 경계라 흉터가 있는 줄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는 열여덟 살에 낳은 큰 형님 만오(71)는 혼인을 시켜 면소재지에 살게 했다. 큰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린 것도 잠시. 한 달 뒤 서른아홉의 어머니가 덜컥 일곱째를 임신한 것이다.
어디다 말도 할 수 없고, 요즘처럼 산부인과가 있어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였다. 손주와 아들을 같이 키우는 경우가 더러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볼썽사나운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말도 않고 자굴산으로 올라가서 언덕을 구르기도 여러 번 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옷이 험해 아버지가 어디서 그렇게 미끄러졌냐며 화를 내시기도 했단다.
구르고 뛰는 것이 효험이 없자 어머니는 독하다는 약초를 드시기 시작했다. 백 가지가 넘는 처방을 했는데도 뱃속의 아이는 건재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나다. 형제들이 모이면 내가 씨름을 잘 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그 때 한 운동과 드신 이름모를 보약 때문이라는 우스개가 늘 나온다.
장조카 보다 딱 한 달 늦은 1963년 7월 29일 매미소리가 우렁찬 한여름에 태어났다.
이런 사연 때문인지 큰 형님은 자기 아들보다 늦은 막내 동생을 끔찍하게 아꼈다. 한번은 형님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마산 둘째 집에 유학을 시킬 요량인데 막내 동생인 나도 함께 보내자고 했다.
아버지는 "만기는 냅둬라. 내 밑에서 농사시킬끼다. 다 나가버리면 적적해서 우째 사노"라며 반대 하셨다. 아버지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지금쯤 영농후계자가 되어 고향마을을 지켰을 것이니 운명이란 참 묘하다.
4학년 겨울 방학 때 마산으로 갔다. 달랑 옷보따리 하나 들고 마산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친구같은 장조카와 20리 길을 걸어 면소재지로 갔다. 뒤돌아 자굴산을 보니 코가 시큰했다. 칼바람이 불었지만 바람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몰려왔다. 정리=이재희 기자 jaehee@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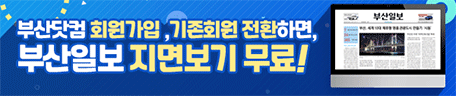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