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백
조성백
글을 쓰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임을 한동안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기계적으로 구상하고 집필하고 퇴고하는, 그런 시간을 한참 보냈다. 그렇게 써낸 소설 속 인물들은 어딘가 나와 동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내뱉는 대사는 싱겁고 어색했으며 무엇보다 울림이 없었다. 껍데기뿐인 말들이었다.
이 소설을 쓰면서 난 화자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가 느꼈을 책망, 죄책, 불안, 회의와 같은 감정들이 잔털을 훑고 피부 깊숙이 내려앉았다. 난 빼곡히 들어선 활자들을 타 넘으며 그를 따라갔다. 안쓰러운 시선으로 쫓았다. 그렇게 마지막 마침표를 넘어서자 난 마음의 방, 그 한쪽 구석에서 웅크린 채 주사위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몹시 익숙한, 동시에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선 남자였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고 싶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줬다.
질책과 격려를 통해 더 깊고 넓은 소설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엄창석 선생님,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 함께 고민하던 작마 회원들, 매번 싫은 내색하지 않고 초고를 읽어준 누나와 소리,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미흡한 글이지만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부족하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항상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다. 모두에게 큰 빚을 진 느낌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조바심 내지 않고 꾸준히, 나 자신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진실된 이야기로 나타내는 일. 아마 그것이 내가 진 빚에 대한 보답일 테다.
약력: 1991년 서울 출생. 경북대 경영학부 졸업. 경북일보 문학대전 금상 수상.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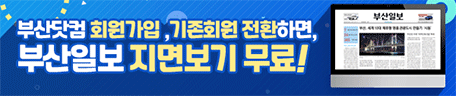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