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딱 이맘때였다.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난 문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개문발차'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골절은 지금 잘 안보여서 며칠 경과를 본 후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엉덩이를 찧으며 차에서 도로로 넘어진 터라 자고 일어나니 엉치쪽이 욱신욱신 거렸다. 뼈에 실금이라도 간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이 좋은 봄날에 병원 신세라니 한숨이 나왔다.
그때 캐스팅 디렉터에게 전화가 왔다. "감서은씨 급하게 캐스팅 건이 있는데, 낼모레 시간 돼요? "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몸으로 이틀 후 과연 촬영이 가능할까 "저기…무슨 작품, 어떤 역할인가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하 넝쿨당) 이라고 방송하고 있는데 아시죠? 거기에서…"
"저 돼요! 할께요!!!"
일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박지은 작가의 작품에다가 존경하는 선생님, 선배님들 나오시고 이건 뭐 골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출연해야 하는 것이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촬영때만 외출을 하겠다 했더니 그건 규정상 곤란하단다. 내 편의를 봐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주변에서는 눈치껏 외출해서 촬영하라며 훈수를 뒀지만 그땐 무슨 배짱이었는지 겁도 없이 퇴원해 버렸다. 그만큼 나에게 촬영은 간절한 일이었다.
촬영 분위기는 스케줄을 알려주는 에프디(FD)의 전화로부터 감지된다.
작품마다 스텝들 분위기가 다른데 넝쿨당은 살가웠다. "선배님 스케줄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호칭은 '선배님'이었다. 내 역할이 양PD여서 난 양PD 선배가 됐다.
촬영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윤여정 강부자 장용 등 기라성같은 선생님들과 김남주, 유준상 선배들이 함께하는 그 작품에서 연기하는 게 정말 꿈만 같았다.
한 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니 너무 아쉬웠다. 양PD는 김남주씨의 방송국 후배로 김남주를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는 캐릭터였다. 주인공의 직장인 방송국 장면이 계속 필요 할 것이고, 분위기상 앞으로 몇 번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대본이 임박해야 나오는 상황이라 그 무엇도 장담 할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 연락이 왔다 "양PD 선배님 또 나오십니다. 대본은 지금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야호! 사랑스러운 에프디 목소리다. 그 이후로 방송국 신이 있을 때는 거의 양PD가 등장했다. 성황리에 작품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시원섭섭한 마지막 촬영을 하고 나니 에프디에게 연락이 왔다.
"양PD 선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일 모처에서 넝쿨당 쫑파티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제가요? 저까지 갈 자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고생해 주셨는데 당연히 와 주셔야죠. 그날 뵙겠습니다"
다들 얼굴이 명함이신 분들이 오는 자리에 민망함을 뒤로하고 참석을 했다. 쭈뼛쭈뼛하니까 안면 있는 선배께서 날 챙겨 주셨다. 인기리에 종영한 작품이니 만큼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홀을 가득 채워서 앉을 곳이 부족할 정도였다.
유준상 선배가 사회를 봤다. K본부 사장의 축하 말씀, 감독과 작가 인사 등이 있은 후 유준상 선배가 출연자를 한분한분 호명하여 인사를 시키셨다. 주조연 소개가 거의 끝나 갈 무렵 "양PD님~ 일어나 주시죠"
허걱, 나까지 호명하여 인사를 시켜주신다. 유준상 선배와는 극중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서 예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다. 많은 분들이 모두 박수를 쳐 주셨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수상이라도 한 듯.
그 자리가 끝나고 2차가 있다고 했다. 에프디가 같이 가자고 잡아 끈다. 박수칠 때 떠나라고 했던가. 나는 차마 2차 술자리까지는 참석할 수가 없었다. 딱 여기까지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에.
연기자로 살면서 주연 조연 단역 모두 경험 해 보았지만, 매니저도 없이 최고 인기 드라마에 이정도 역할로 들어와 이처럼 훈훈한 대접을 받기란 흔치 않은 일이다. 같이 연기한 다른 연기자 동료들과도 합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 김남주 언니가 잘 이끌어 주셨다.
혼자 다니는 내 사정을 안 분장팀과 의상팀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도 행운이었다. 감독도 인간적이셨다. 작가가 글을 따뜻하게 쓰셔서 그런지 팀 전체가 화목한 가족 같았다. 이런 분위기가 이 작품을 잘 되게 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선순환 이라고 작품이 잘되니 분위기는 더 좋아졌겠지. 순풍에 돛단 듯 연말 시상식에서 단연 넝쿨당이 여러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었다.
행복한 경험이 끝난 뒤, 마취에서 풀린 것처럼 한동안 끙끙 앓았다. 앉기도 서기도 불편한 몸 상태로 물리치료를 받고 한방치료도 받고 파스가 내 세컨스킨이 된 나날들이었다. 그 후로도 몇 년 동안이나 제 때 치료하지 못한 사고 후유증이 나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난 치료보다 촬영을 우선 했던 그때의 내 선택을 한번도 후회 한 적이 없다.
연기는 하고 싶다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어야만 하고 여럿이 함께 해야 빛이 나는 일이다. 내가 선택되었을 때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노력하고 관리한다. 내가 그때 아파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나는 이 소중한 체험을 하지 못했겠지.
후유증 치유라는 기회비용이 내 출연료 보다 클 수는 있겠지만 그 해 나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추억을 선물 받아서 행복했다. 그리고 뒤 늦은 지금 넝쿨당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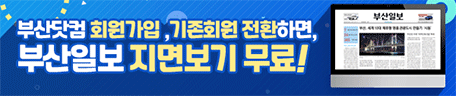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