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2024] “30주년 앞둔 BIFF, 영화제 성장 요인 되짚어야”
■BIFF 들여다보기
영화제 후발주자로 출발한 BIFF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영화제로
주춤한 상승세 해결방안 찾아야
| 2024-10-02 15:39:34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모습.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모습.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개막했다. 높아지는 물가가 무색하게 정부 지원 예산은 삭감되고, 지난해 지도부 사퇴라는 ‘내홍’도 겪었지만 지난해보다 증가한 224편의 공식 초청작은 BIFF의 고군분투를 짐작하게 했다. ‘아시아 영화의 허브’라는 기조 아래 시작한 BIFF는 비전을 ‘아시아 영화의 홈타운’으로 확대·재설정해 세계 최고의 영화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BIFF가 아시아 영화제 중 후발 주자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BIFF가 첫 개막식을 치룬 1996년 9월에는, 이미 아시아 최초의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출범한 홍콩국제영화제(1977년)를 비롯해 싱가포르국제영화제(1987년), 도쿄국제영화제(1985년), 상하이국제영화제(1993년) 등이 이미 아시아 영화제 시장을 장악한 때였다. 그런데도 BIFF는 단기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게 됐다. 매년 영화제 위기론이 등장하는 지금, 그 성장의 요인을 다시금 되뇌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화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지역 축제와는 달리 세계 무대에 영화를 선보이는 쇼케이스적 성격과 영화 마켓으로서의 비즈니스적 성격을 함께 지닌다. 정부 부처와 영화감독은 물론, 제작·투자·배급 등 산업 종사자와 평론가를 포함한 전방위 영화인이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되는 셈이다.
BIFF가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했던 홍콩국제영화제는 관객에게 해외 영화를 소개하고, 해외에 아시아 영화 쇼케이스를 제공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불렸는데, 홍콩 반환과 함께 시대의 동요에 의해 어느새 영화제의 위상이 축소됐다. 그리고 그 틈에 BIFF는 그만큼의 위상을 확보했다. 1990년대 대안적 영화 상영에 지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시네필의 집결과 더불어 BIFF는 지금까지 관객과 마켓, 두 성격을 놓지 않고 추구하였고 이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라는 결과값이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BIFF의 약진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2012년 제17회 BIFF는 참가자 수 2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으나,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BIFF를 둘러싼 여러 갈등과 뒤이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더불어 그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듯 보인다. 아시아 영화의 ‘홈타운’이 되기 위해서 그저 영화제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뻔한 말이지만, 관객(사회)과 정부(국가)의 지속적 참여와 지지 없이는 반쪽짜리 해결에 불과할 것이다.
강지원(부산대 영화연구소 연구원)
 강지원 부산대 영화연구소 연구원
강지원 부산대 영화연구소 연구원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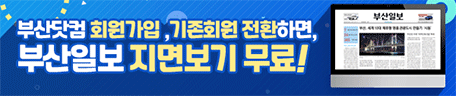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