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투입 첫날 불… 탈출구만 알았어도 살았다" [반얀트리 화재]
60대 인부 마지막 동선 드러나
사전 교육 없어 출구 못 찾은 듯
동료 “안전모 없는 모습에 울컥”
유족, 후속 대책 소걸음에 분통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2-17 18:27:35
 16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청, 국과수, 과학수사대, 고용노동부 등의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정종회 기자 jjh@
16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청, 국과수, 과학수사대, 고용노동부 등의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정종회 기자 jjh@
김 모(66) 씨가 숨진 날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첫날이었다. 안전교육도, 안전모도 없었다. 동료 김 모(57) 씨는 먼지를 막기 위해 검은 비니를 안전모 대신 머리에 두른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다. “탈출구만 알려줬어도 밖에 나왔을 텐데, 그걸 몰라 연기 속에 갇혔다.” 17일 오후 김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수영구 한 장례식장에서 동료 김 씨가 충혈된 눈으로 되뇌었다.
이곳 장례식장에는 김 씨와 함께 막바지 공사에 투입된 양 모(51) 씨 빈소도 마련됐다. 김 씨는 화재가 일어난 지난 14일 처음 투입됐고, 양 씨는 투입된 지 일주일 됐다.
빈소를 찾은 동료들은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숨진 김 씨와 함께 가구를 나르는 작업에 투입됐던 동료 김 씨는 “그 어떤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력사무소 소속이었던 둘은 차량에서 실어 온 가구 상자를 내려, 건물 7~8층에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 한 명이 가구 상자를 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두면, 다른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실어 건물 위로 올렸다. 이날은 숨진 김 씨가 엘리베이터에 싣는 역할을 맡았다.
화재 시점을 전후해 상자를 옮기던 김 씨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상한 분위기에 숨진 김 씨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동료 김 씨는 안전모도,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탈출로만 미리 알려줬어도 옥상에 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이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그 흔한 안전모 하나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고 토로했다. 숨진 김 씨의 부인 A(48) 씨도 “안전모를 안 썼는지 영안실에서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니 재가 떨어졌다”며 “연기 속에 얼마나 오래 갇혀있었는지 영안실 복도부터 매캐한 유독가스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양 씨는 마지막 현장직 근무라고 생각하고 공사장에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큰딸은 15세, 막내아들은 10세, 아직 아버지 손이 필요한 어린 나이다. 그는 올해 처음 자기 집을 사고 한층 여유가 생기면서 현장 근무를 줄여가고 있었다. 처남 이우현(46) 씨는 “이제 막 먹고살 만해졌는데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에 돈 조금 더 벌자고 나갔다가 그렇게 됐다”며 마음 아파했다.
양 씨는 마지막 순간 B동 5층에서 혼자 작업 중이었다.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그는 혼자였다. 이 씨에 따르면 양 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관리자에게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1층에 내려왔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1층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씨는 “원칙대로 2인 1조였다면 먼저 냄새라도 맡은 사람이 끌고 옥상이라도 가지 않았겠나”며 “혼자 있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 갇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숨진 김 씨의 부인 A 씨는 “부산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빈소는 오는데 정작 물으면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발인하는데 합동 분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 창구라도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씨의 처남 이 씨도 “TF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브리핑조차 없다”며 “어디에 어떻게 뭘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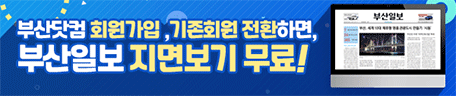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