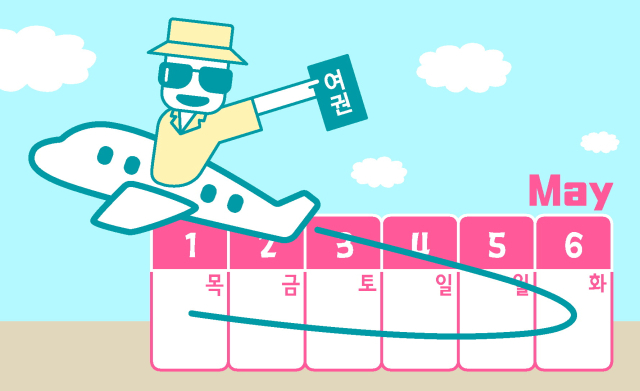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새해 첫날과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7일만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자 휴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노동자가 쉬는 날을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노동생산성도 높일 수 있으리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춘절과 노동절, 국경절 기간 각 7일씩의 연휴였다.
7일씩의 연휴가 세 번이나 있다 보니 중국에서는 연휴로 빠진 노동일을 채우기 위해 연휴 앞뒤 주말을 평일로 간주해 휴일임에도 평소처럼 근무하도록 했다. 한국에 대체공휴일이 있다면 중국엔 대체근무일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대체근무일에 대해 중국인들은 ‘조삼모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023년엔 국경절을 8일 연휴로 만드는 대신 그 직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근무일로 지정해 8일 연휴 뒤 곧바로 7일 연속 근무를 실시하자 노동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일해야 하는 날 쉬는 것보다 쉬어야 하는 날 일하는 데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은 인지상정에 가깝다고나 할까. 결국 중국은 올해 공휴일 관련 법을 손질해 대체근무일로 인한 연속 근무는 6일을 넘길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서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논란이 있었던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됐음에도 연차를 활용해 1일 노동절부터 6일간의 연휴를 만끽하려는 직장인들로 전국이 들썩인다. 직장인들이 연초만 되면 달력에서 법정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를 꼽아보는 건 이제 루틴이 됐을 정도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설연휴와 어린이날, 추석연휴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에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도 있을 듯하다.
과거에는 대체공휴일이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을 4000억 이상 늘리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해외 관광 폭증으로 오히려 국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수 활성화를 내세운 대체공휴일이 되레 내수 발목을 잡는 조삼모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정책 마련 필요성이 커 보인다.
이상윤 논설위원 nurumi@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