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더 먹은 내년에는 ‘리을리을’하게 살아요”
배옥주 시인 시집 <리을리을>
죽음 대하는 다른 시선 포함
‘자는잠’ ·‘수목진단서’ 등 눈길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com | 2024-12-30 10:10:46
 세 번째 시집 <리을리을>을 낸 배옥주 시인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만났다.
세 번째 시집 <리을리을>을 낸 배옥주 시인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만났다.
2008년에는 시, 2022년에는 평론으로 등단해 시와 평론 두 마리 토끼를 좇는 배옥주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리을리을>을 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리을리을>을 뒤적이다 ‘자는잠’이란 시에 꽂혔다. ‘얼마 안 남았어요/등과 바닥 사이/패인 잠이 붙어버렸어요//엄마는 자는잠에 가고 싶다 했어요//손바닥이 들어가지 않을 때/깊이를 헤아리는 윈드벨 소리가/가까워졌다 멀어져요.’
등이 바닥이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 이 시는 시인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는잠’이라는 낯선 단어가 왠지 반갑고 공감이 갔다. 유지현 문학평론가는 “배옥주의 시는 통증에서 배태된다. 자는잠에는 죽음을 둘러싼 통증, 그로 인한 일상의 파열을 벗어나 존재의 존엄을 유지한 채 종말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고 평했다.
연말이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죽음이란 단어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수목진단서’에는 죽음을 대하는 시인의 남다른 시선이 느껴진다. ‘병상에 누운 몽당연필//무딘 심을 꽉 쥔 채/그늘을 눌러 그리고 있다//해마다 바꿔 쓴 수족 자음/염라가 이 글자는 걸레로 읽은 탓에/긴 요도관에 꽂힌 몇 해 밤낮이/하릴없이 지나가고//안간힘을 다한 흑연 끝에/침이 묻어 있다//여생을 여음이라 고쳐 읽는다//석션 중인 주목/빗살무늬도 그늘이다.’
힘들게 찾은(?) 광안리 해수욕장의 ‘리’자 앞에서 이 시에 대한 배 시인의 해설을 들었다. 그는 “서울 창덕궁에 갔을 때 750살이 넘는 나무를 애써 살리려고 인간들이 수액 주사를 주고 뭘 받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에게 연명치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저 나무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싹을 틔운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애써 살리려는 마음과 자연스러운 죽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생이 여음으로 바뀌는 순간 마법처럼 잔잔한 여운이 발생한다.
‘오름을 내려온 조랑말의 저녁도/한 호흡씩 들어가고/한 호흡씩 나가야 합니다/방목은 풀어놓는 게 아니라 드나드는 것/… 갈기를 눕힌 순결한 산맥이/리을리을 흘러갑니다/리을리을/평지로 흘러갑니다.’ 표제시 ‘리을리을’은 제주도 오름의 말 목장에서 떠올랐다고 했다. 목장에는 리을(ㄹ)자를 닮은 말이 드나드는 문이 있다. 이 문은 말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지 말라고 설치한 것이었다. 배 시인은 “ㄹ과 ㅇ이 붙어 부딪히는 그 안에서 좀 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리을리을은 유연한 사고를 의미한다. 내가 그동안 유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리을리을에 애착이 간다”라고 말했다. 시인은 당신도 내년부터는 좀 리을리을하게 살라고 말하는 듯했다. 글·사진=박종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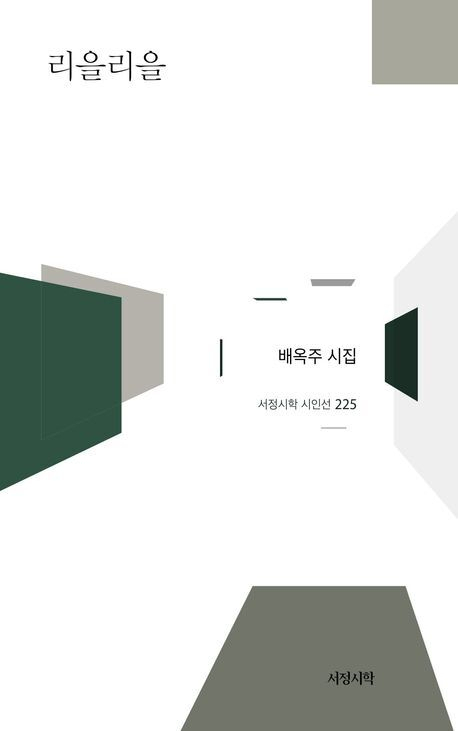 <리을리을> 표지.
<리을리을> 표지.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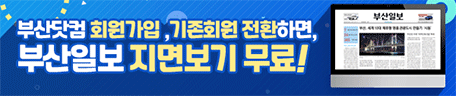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