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에스투데이 황성운 기자] 자신의 기억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1일 개봉된 마이클 페트로니 감독의 ‘백트랙’은 어릴 적 경험한 충격적인 사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피터(애드리안 브로디)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진실을 추적해가는 공포물이다. 기억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운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터의 상황이 딱 그렇다.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정신과 의사 피터는 환자를 돌보면서 딸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 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딸과 비슷한 또래의 의문의 소녀 엘리자베스(클로이 베일리스)가 나타나고, 이후 피터는 환영과 악몽을 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는 소녀를 비롯해 자신이 상당하던 환자들이 모두 유령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반전처럼 보였던, 하지만 너무 눈에 보였던 유령의 존재에 맥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피터는 그 유령들이 모두 1987년 자신의 고향에서 발생한 열차사고 희생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에 감춰진 진실에 접근해 간다.
피터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열차사고의 모습은 진실과 한참 어긋나 있다. 어릴 적 충격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기억의 뒤틀림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식스센스’ ‘디 아더스’ 등과 같은 영화들이 연상된다. 감독은 직접 “‘식스센스’의 오마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백트랙’은 피터의 기억을 기반으로 공포의 실체를 쫓는다. 피터의 기억과 실체는 영화를 몰입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그리고 피터의 추리가 계속될수록 반전이 거듭된다. ‘반전 강박증’에 갇힌 작품들이 대부분 피곤함을 안기는 데 반해 ‘백트랙’은 반전 과정에 추리를 더하면서 그 피곤함을 긴장감으로 바꿔 놓는다.
매력적인 부분은 결말이다. 유령의 도움을 받아 피터가 접근한 진실의 실체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인면수심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때론 유령이나 미지의 존재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마주하기 싫었던, 어쩌면 일부러 피했던 기억과 분명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 ‘백트랙’의 결말이 강조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더 섬뜩하다. 결말의 반전이 지닌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애드리언 브로디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90분 내내 영화를 이끈 그는 상실과 죄책감, 기억에 대한 복잡한 감정 등을 디테일한 감정으로 표현, 슬픔과 공포가 공존하는 영화의 분위기를 완성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사진=수키픽쳐스 제공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비에스투데이(www.bstoday.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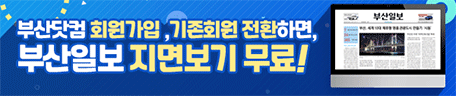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일주일 앞 다가온 추석](/nas/wcms/wcms_data/photos/2021/09/12/2021091219440255138_m.jpg)
